무룡산하 우거 기도실에서 다시 불교를 생각해보다
작성자 정보
- 명광 작성
- 울산 북구 지역
컨텐츠 정보
본문
ㅡ무룡산하 우거 기도실에서 다시 불교를 생각해보다ㅡ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세계에는 약 2만여 개의 종교와 종파가 있으며, 이 모든 종교는 신의 선택을 받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스스로 신을 선택하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교에서는 신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신에 대한 불경(不敬)은 허용되지 않지만, 불교에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허용됩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믿기만 하면 복이 온다"는 쉽고 편한 입장이지만, 불교에서는 "의심하라! 그러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일찌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노예요, 나를 배우는 자는 나의 제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도(信徒) 또는 신자(信者)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불교 신도 대신 불자(拂子, 부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앙과 생활이 이원화되어 있으나, 불교에서는 성불(成佛, 깨달음)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고 기도해야 하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고 생활하는 모든 것(行住坐臥, 語默動靜)이 불교적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사스님께서는 수행자에게 각자의 근기에 따라 "무(無), 뜰 앞의 잣나무, 부처는 똥막대기, 이뭣꼬?" 같은 화두를 내려 꾸준히 의심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경책하십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불교에서 지혜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깨우침이 동반된 앎을 말합니다.
따라서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지식, 공안, 화두, 문자, 언어 등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지식이나 언어를 초월하여 생각이나 사고가 끊어져버린 자리가 지혜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자비란 단순한 이해나 공감, 동정심이 아니라 지혜가 깃들어 있는 측은지심을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데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금강경(宗教를 떠나 전 인류의 필독서임)에서는 아상(我相, 나라는 고집), 인상(人相, 사람이다라는 고집), 중생상(衆生相, 부처가 아닌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상(壽者相, 오래 산다는 생각)을 깨어버리는 것이 지혜를 터득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합니다.
# 고정관념에 대한 사례
팔공산 파계사 말사 성전암 조실 철웅스님 법문에 의하면, 단종 복위를 노린 사육신(死六臣)은 자신들이 충신이라는 고집을 끝까지 깨지 못하여 죽어서 지옥에 갔고, 세조는 말년에 스스로 지은 죄를 통절히 참회하면서 겸허해졌기에 죽어서 극락에 갔다고 합니다.
@불교는 공과 중도의 종교다
불교에서 공(空)은 단순히 무(無), 텅 빈 공간이 아니고, 무(無)와 유(有)를 모두 포함하는 통섭적인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봅니다.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볼 때 손의 전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직육면체를 관찰할 때 위와 아래, 좌와 우, 앞과 뒤를 모두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 직육면체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 꿰뚫어 봐야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空)의 이해에 대한 사례
밤과 낮은 공(空)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보면 밤과 낮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계나 달에서 지구를 보면 밤과 낮이 없습니다.
따라서 밤과 낮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체가 없이 공(空)할 뿐입니다.
즉, 일체의 사물이 실체 없이 공(空)함을 알 때 진리에 한 발자국씩 다가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불교에서 중도란?
중도는 어떤 사물이나 견해의 중간이 아니라 양자의 조화를 넘어선 통찰입니다.
우리 인생은 생(生), 노(老), 병(病), 사(死)의 고해(苦海)를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고(苦)의 원인은 집착과 번뇌, 망상에서 비롯되며, 집착과 번뇌, 망상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옵니다.
이러한 탐(貪), 진(嗔), 치(痴)가 없으면 번뇌와 집착도 없고, 따라서 고통도 없게 됩니다.
이 탐ㆍ진ㆍ치라는 삼독심(三毒心)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중도(中道)입니다.
중도는 양극단의 조화(調和)이며 통섭(統攝)입니다.
# 중도에 대한 사례
현실 정치에 여당과 야당이 있듯이 불문에서는 대중들이 동당과 서당으로 나뉘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공사가 있을 때 동당 스님들과 서당 스님들이 자유롭게 토론하여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논쟁이 계속 평행선을 이루면 끝장토론까지 하여 일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어느 큰 절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 동당에 있다가 서당에 갔다가를 반복하며 어느 날 동당 스님과 서당 스님이 서로 자기 고양이라고 주장하다가 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때, 큰 스님께서 싸움 현장에 나타나 아무 말 없이 신고 있던 짚신을 머리에 이고 앉아 계셨습니다.
동당과 서당의 모든 대중들이 의아해하며 수군대다가 차츰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컨대, 큰 스님께서는 "모자도 발에 끼우면 신발이고, 짚신도 머리에 얹으면 모자가 되듯, 동당 고양이나 서당 고양이나 결국 우리 절 고양이인 것을 싸움에서 무슨 소용이 있으랴?"라고 경계한 것이리라 합니다.
이 중도를 실천하려면 삼학, 즉 계(戒), 정(定), 혜(慧)를 닦아야 합니다.
- 계(戒):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계율
- 정(定):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정화시켜 나가는 것
- 혜(慧):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계(戒)가 필요하고, 성냄을 가라앉히기 위해 정(定)이 필요하며, 무지나 어리석음을 바로잡기 위해 혜(慧)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원성취기도처 관음정사 대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대한명리학회 회장
대한작명철학회 회장
교당명리학당 대표 교수
명궁작명철학관장 자향법사 심재민(춘봉)
(010-3325-2729)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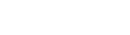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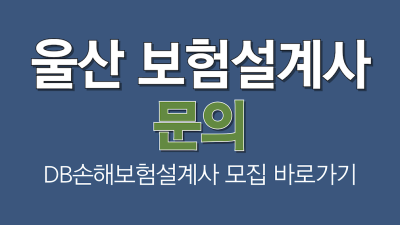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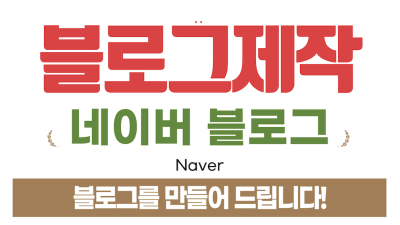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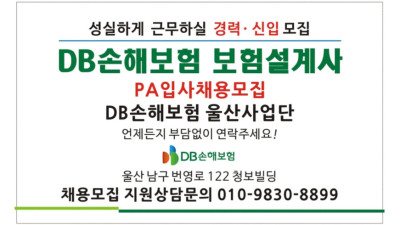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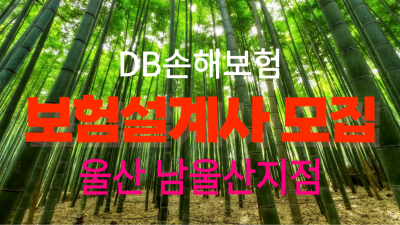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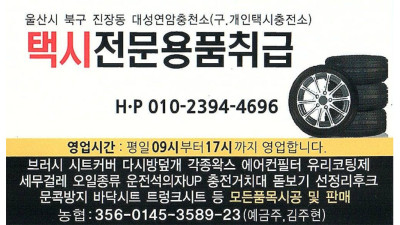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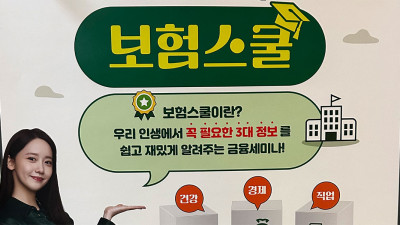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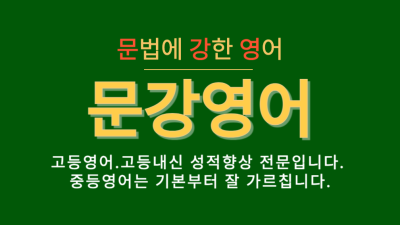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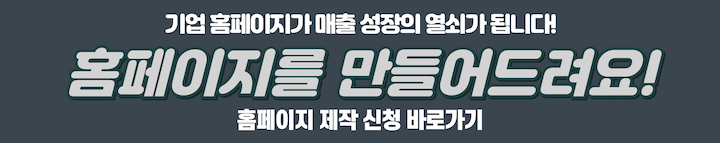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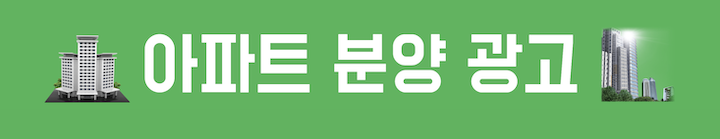

![[두근두근] 소개팅 - 진지한 만남, 자연스럽게 시작해요!! [두근두근] 소개팅 - 진지한 만남, 자연스럽게 시작해요!!](https://adnamecard.com/imgAd/banner02.png)





